뇌 먹는 아메바 (치사율 95%·증상)
공포의 뇌 먹는 아메바... 일단, 감염되면 무조건 사망
- 여러분은 가끔 잊을 만 하면, 뉴스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. [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누구누구], [수돗물에서 나온 뇌 먹는 아메바 검출] 등등...

특히, 미국에서 해당 아메바에 대한 뉴스 대부분이 나오고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기사 또한 대부분입니다. 얼마전에 오랜만에(?) 해당 소식이 국내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던데, 뇌 먹는 아메바는 이미 등장한지 [수십년]이 넘은 녀석입니다.

그래서 이번엔, 이 [뇌 먹는 아메바]로 알려진 [네글레리아 파울러리]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다행히, 우리나라에는 감염된 사람도 없고 해당 아메바가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만, 주의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
1. 뇌 먹는 아메바 - 네글레리아 파울러리


- 일반적으로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이 녀석은 정식 명칭인 학명 [네글레리아 파울러리(Naegleria fowleri)]로, [페르콜로조아류(Percolozoa)]에 속하는 자유생활성 아메바입니다.
보통, 25~35℃ 정도의 온수 환경에서 발견되며 다른 아메바류와 달리 [생활환(Life cycle)] 안에 편모형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.

인간에게 병원성을 보이며, [원발성 아메바성 수막뇌염(Primary amoebic meningoencephalitis, PAM)]을 일으킬 수 있는데, 중추신경계가 침범당하면서 처음에는 후각인지(냄새나 맛)의 변화가 일어나고, 이어서 메스꺼움·구토·발열·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서 급속하게 혼수상태로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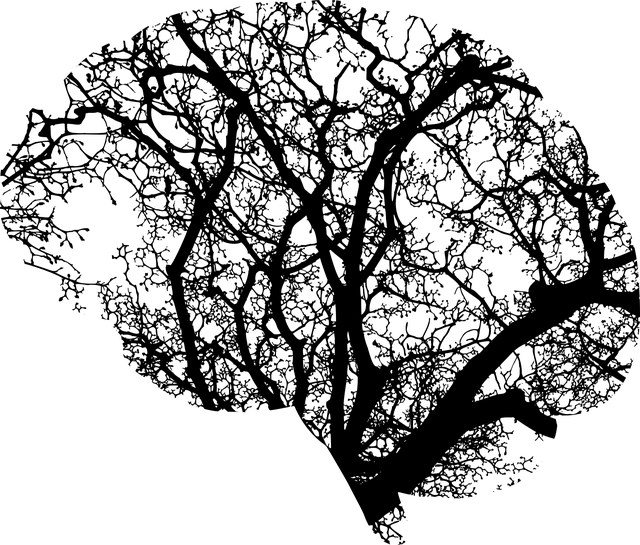

이 때문에 [살인 아메바]라고 불리기도 하며, 상기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선 [뇌 먹는 아메바]로 유명합니다. 치사율은 일단 감염되면 95% 이상이라고 합니다.
해당 아메바는 1965년, 호주 노스 애들레이드에 있는 [위민스 앤드 칠드런스 병원(Women's and Children's Hospital)] 병리학자였던 [Malcolm Fowler]에 의해 발견되었으며, 학명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.
2. 병태


-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호수나 온천 등, 따뜻한 담수 환경에서 번식합니다. 보통 원발성 아메바성 수막뇌염 면역 억제 전력이 없는 건강한 어린이나 젊은 사람에게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서식하는 담수와 접촉하면, 뇌 먹는 아메바가 코로 들어가면서 사람이 발병하는 구조입니다.
뇌 먹는 아메바는 후점막과 콧구멍 조직을 관통, 후구의 현저한 괴사와 그에 따른 출혈이 발생합니다. 아메바는 거기서부터 신경 섬유를 더듬으면서 두개저를 통과해 뇌로 도달합니다.


심각한 진균증, 리슈만편모충증에 대한 항진균제인 [암포테리신 B(amphotericin B)]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대한 현재 [가장 효과가 있는 약물요법]입니다만, 아메바성 수막뇌염이 발병한 경우의 예후는 심각하며 임상에서는 수십 년 동안 겨우 8명의 생존자만 있었을 뿐입니다.
암포테리신 B는 실험에선 해당 아메바를 괴멸시키고, [리팜피신(rifampicin)]과 더불어 바람직한 선택사항이며, 더욱 공격적인 항체 혈청에 기초한 처치가 검토되고 있고 나아가 광역 항생물질보다 효과적일지도 모르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


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감염자가 살아있을 때 진단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,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진단이 치료 성공에 대한 매우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
뇌 먹는 아메바는 여러 종류의 액체무균배지나 세균을 바른 무영양 한천배지에서 생육이 가능하며, 물로부터의 검출은 물 시료에 대장균을 더해 원심 분리하고 그 침전을 무영양 한천배지에 더해 실시합니다.
며칠이 지난 후에 한천배지를 검경하고, 해당 아메바의 Microbial cyst를 형태적으로 [동정(同定, 생물의 종 이름을 확인하는 작업)]하며, 종에 대한 최종 확인은 다양한 분자생물학·생화학적 수법으로 행해집니다.
아직 감염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와 다르게, 일본에서는 1996년 11월에 사가현 도스시에서 25세 여성이 발병(7일째 의식불명, 9일째 사망)한 것이 한 건 존재하며, 현재까지 유일한 감염 사례입니다(감염경로는 불명).

사망 후 해당 여성에 대한 병리 해부에서는 [뇌가 반구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연화되어 있었다]라고 합니다. 즉, 뇌 먹는 아메바 때문에 뇌가 흐물흐물해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.
미국은 196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134차례 감염 사례가 있으며, 그중 생존자는 단 3명입니다.
수많은 감염 사례 중 하나를 다루어보자면, 2011년 루이지애나주에서 남자 대학생과 50대 여성이 잇따라 감염·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


두 희생자의 집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을 철저히 검사한 결과, 남자 대학생의 집에서는 온수기와 50대 여성의 집에서는 욕조의 배수구 등에서 뇌 먹는 아메바를 검출했습니다.
알고 보니, 두 사람 모두 축농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코막힘을 개선하기 위해 [코 세척기]를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고, 두 사람 모두 코 세척기에는 증류수나 살균된 물을 사용해야 했는데 수돗물을 사용했으며, 코 세척기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반복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이에 따라, 보건소는 각 집의 온수기 욕조 안에서 증식한 아메바가 공중을 떠다니며(혹은 온수기>수돗물>코세척기 경로) 손질이 덜 된 코 세척기 내에서도 증식, 이를 통해 코를 세척하다 비강에서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.
그렇기에 부적절한 코 세척기 사용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내놓았으나, 그 이후로 아직 코 세척기를 통한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, 이 감염 사례는 꽤 특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

쉽게 말하면, 본인들이 좌초한 결과이기는 하나 그걸 고려해도 운이 억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
좀더 자세한 뇌 먹는 아메바에 대한 정보는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[영문 위키피디아]
'지식백과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광운대 KLAS (+수강신청) (0) | 2020.10.19 |
|---|---|
| 디스코드 연결안됨 꿀팁 (해결방법!) (0) | 2020.10.18 |
| 인천상륙작전 (맥아더·도쿄회담) (0) | 2020.09.28 |
| 동해? 일본해? 앞으론 둘 다 안 쓴다 (일본 반응) (0) | 2020.09.21 |
| 벌금형 (전과기록) (0) | 2020.09.18 |







